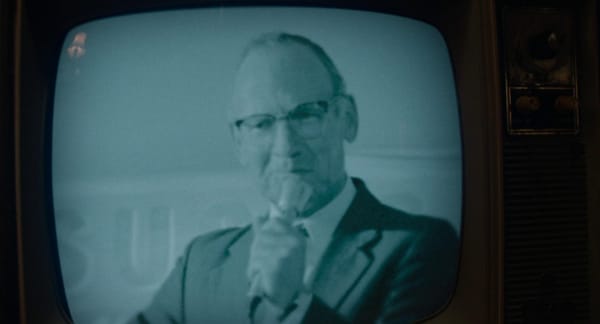
설명충의 비극
소설을 쓰다 보면 독자에게 뭔가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 주인공의 과거, 세계관의 룰, 복잡한 관계도 같은 것들.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한다. 길게, 자세하게, 빠뜨릴 게 없도록. 독자는 3페이지째 하품을 한다. 인포덤프(infodump)라는 말이 있다.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글쓰기에서 가장 지루한 순간 중 하나다. 작가들은 항상 독자가 더 많은 설명을
표면을 의심하되, 냉소하지 않기. 각주를 달되, 본문을 잊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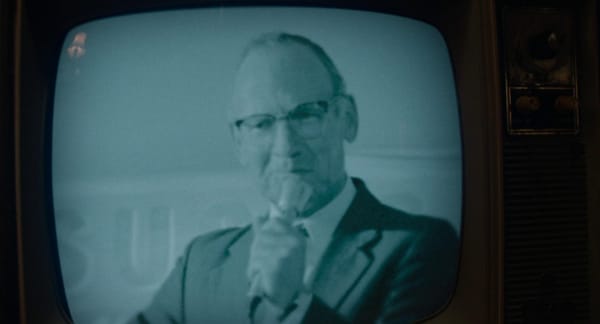
소설을 쓰다 보면 독자에게 뭔가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 주인공의 과거, 세계관의 룰, 복잡한 관계도 같은 것들.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한다. 길게, 자세하게, 빠뜨릴 게 없도록. 독자는 3페이지째 하품을 한다. 인포덤프(infodump)라는 말이 있다.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글쓰기에서 가장 지루한 순간 중 하나다. 작가들은 항상 독자가 더 많은 설명을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를 보다가 중간에 끄면 찜찜하다. 다음 에피소드가 자동 재생되기 전에 끄려고 하는데, 결국 새벽 3시까지 봐버린다. "다음 편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잠이 와." 이게 종결욕구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는 불확실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다. 스타트업에서 흔한 풍경이다.

위스키 병에 적힌 이름을 보면 당연히 그 회사가 만든 술이라고 생각한다. 글렌피딕은 글렌피딕이 만들고, 맥캘란은 맥캘란이 만든다. 그런데 사마롤리(Samaroli)라는 이탈리아 회사는 단 한 방울의 위스키도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 위스키 세계에서 전설이 됐다. 1968년, 로마의 한 남자가 스코틀랜드 증류소들을 찾아다니며 이상한 제안을 했다. "당신들이 만든 위스키를 통째로 사서

공감
유튜브에서 울면서 이별 얘기하는 영상을 봤다고 치자. 인지적 공감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헤어진 게 상처가 됐겠네”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감정의 원인을 분석한다. 차가운 건 아니다.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 정서적 공감은 화면 속 그 사람과 같이 울컥하는 것이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실제로 눈물이 날

1976년 몬트리올에서 동독은 금메달 40개로 2위를 했다. 소련이 49개로 1위, 미국이 34개로 3위였다. 인구 1600만 명의 동독이 6100만 명인 서독(금메달 10개, 4위)보다 4배 많은 금메달을 딴 것이다. 특히 여성 수영에서 압도적이었다. 개인전 금메달 11개 중 9개를 휩쓸었다. 미국 수영 선수 웬디 보글리올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들은 매우

운동에는 GPP와 SPP가 있다. 기초 체력과 종목별 전문 기술. 농구 선수가 축구로 전향해도 기초 체력은 그대로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SPP는 도메인 지식이다. 마케터가 구글 애즈에서 메타 광고로 옮기면 다시 배운다. 개발자가 자바에서 파이썬으로. 디자이너가 포토샵에서 피그마로. GPP는 다르다. 이메일 쓰는 법. 자료 정리하는 법. 질문하는 법. 시간 지키는 법. 링크드인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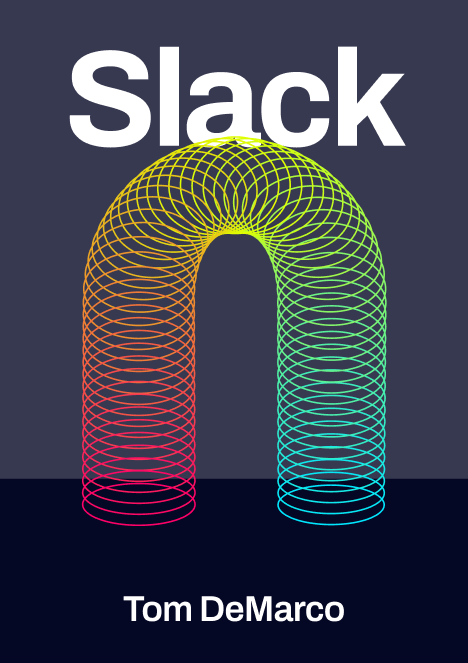
톰 디마르코는 "Slack"에서 말했다. "조직은 진짜 효과보다 바쁜 척을 보상한다."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이 더 심하다. 네 가지 유형 낙관적 편향 모든 일이 간단해 보이는 사람들. 디마르코가 말한 "optimism bias"의 화신. 마케팅 팀장이 말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냥 DM 보내면 되지."

넷플릭스를 켠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섹션을 본다. 세 번째 추천작을 클릭한다. 이게 내 선택일까, 알고리즘의 선택일까? 프랑스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글레르는 인간이 기억을 외부에 맡겨왔다고 했다. 동굴 벽화부터 시작해서 책, 사진, 그리고 지금은 클라우드까지.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게 된 건 전화번호부가 나온 이후고, 길을 외우지 않게 된 건 네비게이션이 나온

어제 카페에서 옆 테이블 커플을 보다가 깨달았다.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말에 재채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 회사에서—”“아 또 회사 얘기야?” “그런데 말이야—”“말이 많네.” “이해해줘—”“맨날 이해하라고 하네.” 재채기는 막을 수 없다. 코가 간지러우면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의 소통습관 중에도 재채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다. 상대방이 뭔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에서 당(Party)이 마지막으로 장악한 건 폭력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였다. 2+2는 5다. 믿거나... 아니면 말거나. 요즘 유튜브(YouTube) 댓글창을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쪽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이번 캠페인 성공 확률이 80%입니다." 대기업 회의실에서 누군가 자신 있게 말한다. PPT에는 그럴듯한 그래프가 가득하다. 그런데 정작 그 80%가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10번 중 8번? 100번 중 80번? 아니면 그냥 "꽤 높다"는 뜻? 확률은 참 묘하다. 내일 해가 뜰 확률은 100%라고 확신하지만,

"나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해서 실망도 안 해." 요즘 이런 말이 인생 철학처럼 떠돈다. 카페에서, 술자리에서, 심지어 링크드인 프로필에서도. 아무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숙함의 증표가 된 시대. 루스벨트가 말한 "cold and timid souls"가 오히려 현명한 사람으로 포장되고 있다. 인스타 릴스를 보면 더 재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