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로리 카운팅의 역설: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법
역설의 시작점 2,000칼로리를 먹고 2,500칼로리를 쓰면 500칼로리 적자. 한 달이면 2kg. 열역학 제1법칙은 부정할 수 없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는 앱을 깔고 숫자를 센다.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계획은 완벽하다. 숫자는 명확하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기를 비웃는다. A와 B가 있다. 같은 키, 같은 체중,
표면을 의심하되, 냉소하지 않기. 각주를 달되, 본문을 잊지 않기.


역설의 시작점 2,000칼로리를 먹고 2,500칼로리를 쓰면 500칼로리 적자. 한 달이면 2kg. 열역학 제1법칙은 부정할 수 없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는 앱을 깔고 숫자를 센다.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계획은 완벽하다. 숫자는 명확하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기를 비웃는다. A와 B가 있다. 같은 키, 같은 체중,

2024년 11월에 MCP가 나왔다. 테크 커뮤니티는 떠들썩했다. Hacker News 1위 올랐고, 개발자들 트위터(이제 X)에서 실험 결과 올렸다. 근데 같은 시기에 GPT-5 루머가 돌았고, Gemini가 업데이트됐고, 새 AI 모델이 또 나왔다. MCP 얘기는 금방 묻혔다. 신기술이 쏟아지는 시대다. 매주 새 모델, 매달 새 벤치마크.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랩퍼끼리 디스하다가 법원까지 간 사건이다. 드레이크가 자기 소속사 UMG를 고소했다. 켄드릭 라마가 "Not Like Us"란 곡에서 드레이크를 소아성애자로 몰았는데, UMG가 이걸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다. 아니, 오히려 봇 돌리고 페이올라까지 써서 이 곡을 띄워줬다고 주장했다. 2024년 미국 연방법원의 자넷 바르가스 판사가 목요일에 이 소송을 기각했다. 문제의 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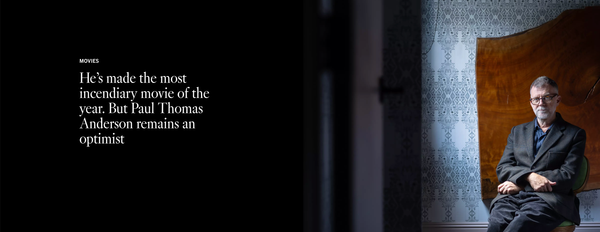
He’s made the most incendiary movie of the year. But Paul Thomas Anderson remains an optimistThe director of “Boogie Nights” and “There Will Be Blood” returns with an angry epic about American dissent, born from grappling with Thomas Pynchon’s “Vineland.”Los Angeles TimesFollow 폴 토마스 앤더슨의 새 영화

OpenAI가 2025년 10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DevDay를 열었다. 개발자 행사인데 처음으로 언론을 불렀다. 1,500명이 넘게 왔다고 한다. 뭔가 크게 터뜨릴 거란 예고였다. 챗봇에서 플랫폼으로 ChatGPT를 지금까지 어떻게 썼나. 질문하고, 답 받고, 끝. 필요하면 복붙해서 다른 곳에 쓰고. 이제 그 안에서 다 된다. Apps SDK가 나왔다. Canva, Zillow, Coursera 같은 서비스들이

이 글은 Psyche.co에 게재된 Ivar Fahsing의 "How to think like a detective"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드라마 속 형사들은 대부분 천재다. 범인이 남긴 머리카락 한 올로 사건을 해결하고, 커피잔에 묻은 립스틱 자국만 봐도 범인의 심리를 꿰뚫는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바르 파싱(Ivar Fahsing)은 노르웨이 경찰대학 교수다.

결국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모두가 병살타를 피하고 평균 타율에 수렴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회의실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곧바로 나오는 질문들. "데이터 있어요?"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기존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창업 영상들을 보라. "안전한 투자&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안 하는 사람들. "아, 이거 살까 말까" 하면서 몇 번이고 페이지 새로고침하는 사람들. 마치 구매가 죄라도 되는 것처럼. 근데 알렉스 호르모지(Alex Hormozi)는 정반대로 말한다. 사람들은 원래 사고 싶어한다고. 구매 욕구는 기본값이다 생각해보면 맞다. 새 신발 보면 갖고 싶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 보면

증권사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깔기를 3번째 하고 있다. 매번 "이번엔 장기투자만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빨간불이 켜지면 손가락이 먼저 움직인다. 매도, 매수, 또 매도.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으니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수수료만 증권사에 갖다 바쳤다.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 사람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한다.

"하버드 연구진이 개발한 그 성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효과적인지 아는가? 정보는 최소한으로, 상상은 최대한으로 만들어서다. 하버드라는 권위 + 개발이라는 혁신 + 성분이라는 과학적 느낌 +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만드는 친밀감. 네 개 요소가 합쳐져서 독자 머릿속에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를 그려낸다. 이게 바로 다크 카피라이팅이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라고 생각하는 그 얼굴도, 실은 어제의 얼굴이 아니다. 피부 세포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메운다. 2-4주면 표피층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 한 달 전 연인과 손 잡았던 그 손은 이미 없는 셈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우리 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다. 끊임없이

블랙스톤이 준오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떴다. 1982년 시작된 한국 미용실 체인에 글로벌 투자회사가 돈을 넣었다는 얘기다. 흥미로운 건 보도자료의 단어 선택이다. "헤어케어 브랜드"가 "통합 뷰티 웰니스 플랫폼"이 됐다. 미용실이 플랫폼이라니. 실제로 준오는 미용실 180개, 직원 3천 명, 아카데미까지 운영한다.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에도 진출했고 일본과 태국에는